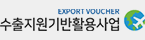-
[2015.10.6 Korea times] 자본주의 옹호
- 작성일 : 2016.03.10
- 조회수 : 492
자본주의 옹호
 |
필자는 이번 칼럼에서 잠시 외국인투자 옴브즈만이라는 직책을 미뤄놓고 예전 경제학 교수의 신분으로 돌아가 빈부격차 심화로 궁지에 몰린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논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자본주의에 어떻게하면 ‘인간의 모습’을 씌울수 있는지 모색하고자 한다. 2007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침체는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를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게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자본주의의 실패로 규정하고 “따뜻한 자본주의” 또는 이 보다 나은 경제시스템 또는 이데올로기를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과연 ‘따뜻한 자본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1970년대 어느 추운 겨울날, 당시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던 필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친구 리처드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던 길이었다. 리차드는 귀를 덮지 않는 러시아 코사크 모자를, 필자는 귀까지 덮는 털모자를 쓰고 있었다. 미네소타州 출신인 리처드에게 춥지 않냐고 묻자 “춥긴 하지만, 세인트폴(미네소타州 주도)은 시카고보다 더 춥다네”라고 그는 대답했다. 이처럼 아주 덥거나 춥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의 기후가 어떠했느냐에 달려 있다.
자본(capital)이라는 단어는 12세기~13세기 사이 “가축의 머리”를 뜻하는 라틴어 “caput"에 어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자는 자본을 소유한 자를 의미한다. 시장경제의 개념은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아담 스미스에 의해 정립됐고, 그는 시장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된다고 했다.
아담 스미스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결국 국부가 증진한다고 설파했다. 즉,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이기적인 소비자와 높은 가격에 매매하려는 이기적인 판매자가 시장에서 만나면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가격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이다. 아담 스미스의 등장과 함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채택했다. 또한 공급측 경제학을 강조한 고전파 경제학자들도 계획경제체제 (공산주의) 대신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지지했다.
경제 대공황(1929-1933) 이후,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위기에 빠졌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1883-1946)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주장했다. 그리고,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자본주의를 채택한 수많은 정부는 케인즈가 처방한 “정부개입 정책”을 수용했다.
반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케인즈학파의 “정부개입” 논리가 만연해지는 것을 우려했고, 1947년에는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MPS)를 창립했다. MPS는 ‘보이지 않는 손’과 시장경제의 주창자 아담 스미스를 신봉했다. 한편, 자유시장 경제학자들도 공해, 국방,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1912-2006), 개리 베커(1930-2014) 이렇게 세 사람이 차례로 이끌어온 MPS는 시장중심 경제체제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단점도 함께 연구하고, 회원간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이었다. 하이에크, 프리드먼, 베커는 모두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보장하고, 재산의 개인소유는 사회에서 보다 열심히 일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 따라서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앞으로도 복지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상황은 다시 역전되었다. 1997년에는 아시아금융위기, 2007년에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자본주의의 몰락을 주장하는 반자유주의 목소리가 증폭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커교수는 국가적 차원의 현명하지 못한 정책과 국제적 차원의 정책공조 부족이 경제위기를 불러 일으킨 것이라며 반대자들의 비판을 일축했다.
베커교수는 2014년 5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자본주의를 옹호했다. 그는 “일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만이 대중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탄탄한 중산층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며, 공기업에 실망한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 조차 금융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더 많은 민간의 참여를 촉구했음을 지적했다.
사회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따뜻한 자본주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다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1. 자본주의의 “따뜻함”이란 문화,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소득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다. 2.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시스템과 재산의 개인소유가 병행되어야 한다. 3. 조세, 복지, 자본시장개방 등의 분야에서 보다 현명한 정책을 펴야 한다. 4. 끝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국제적인 정책공조체계가 강화되야 한다.
Link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5/10/197_188022.html